
조선시대에는 기휘(忌諱, 피휘)라는 문화가 있었다.
본디 휘(諱)는 죽은 사람 혹은 집안 조상의 이름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뿐만 아니라 왕이나 제후들의 이름도 포함되었다.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한 존경, 예의의 표현으로써 이러한 휘를 발음하거나 쓰지 않았다. 이를 기휘 혹은 피휘라 한다.
요즘에 빗대자면 대통령 박근혜의 이름 중에서 근, 혜 자는 입으로 소리 내거나 글자로 쓸 수 없었다는 얘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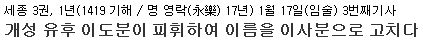

세종실록에 보면 오늘날의 개성 시장에 해당하는 이도분이라는 사람이, 세종의 본명인 이도(李裪)와 '도' 자가 음이 같아 개명한 예가 있다.


충청도 지사에 해당하는 이도역이라는 사람도 세종의 이름과 음이 겹쳐 이인역으로 개명하였다.

연산군 대에는 유생들이 임금의 이름 글자를 발음했다는 이유로 귀양을 가기도 하였다.
이는 사람 뿐 아니라 지명도 예외가 아니었다. 현재 대구광역시인 대구는 대구(大丘)였으나,
공자의 본명인 공구(孔丘)와 겹쳐 대구(大邱)로 글자를 고쳤다.

영조 대의 어느 날에는, 승지(오늘날의 비서)가 임금에게 올리는 상소문을 읽다가 어느 대목에서 말을 잇지 못했다.
이유인즉슨 상소문에 영조의 본명인 금(昑) 자가 적혀 있어 읽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이에 영조는 "승지가 읽지 못하는데, 반드시 그럴 필요가 없다. 읽어도 된다."
하며, 덧붙여 "본명 이외에도 이름 자와 음이 같은 글자까지 피하는 것은 지나치다." 며 그 범위를 좁히라 명했다. - 연려실기술

이런식으로 기휘로 인한 불편함을 방지하기 위해 조선 왕조의 역대 임금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잘 쓰이지 않는 글자를 써서 외자로 했다.
그 유명한 태조 이성계도 즉위 후에는 아침 단(旦) 자를 써서 '이단' 으로 개명하였으며, 고종도 이명복이라는 본명을 버리고 이희로 개명했다.
이는 앞서 말했듯 한국 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등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문화로써.
중국의 경우에는 당 고조 이연(李淵)의 연 자를 범할 수 없어서 고구려의 연개소문을 기록할 때 연 자를 천으로 고쳐 천개소문으로 기록했다.
이렇듯 당시에는 이름 석 자가 단순한 이름 그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고 볼 수 있다.
3줄 요약
1. 동아시아 문화권에는 기휘(忌諱, 피휘)라는 문화가 있다.
2. 집안 어른은 물론 옛 왕과 제후, 성현들의 이름에 해당하는 글자를 쓰거나 발음하지 않는 것이다.
3. 이로 인한 백성들의 불편함을 예방하기 위해 왕들은 외자의 이름으로 개명했다.
출처















